사심과 사심이 만나는 순간
2022 웹진 연극in 희곡 공개모집 현장감상회
전서아
제219호
2022.05.26
사심(私心): 사사로운 마음. 또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
사심을 갖는다는 건 뭘까요?
2021년 연극in ‘다른 손(hands/guests)’ 희곡 공개모집에 참여하며, 가장 생생히 기억나는 경험은 바로 현장감상입니다. 당시 저는 「무루가 저기 있다」라는 희곡을 제출했습니다. 서울연극센터로 향하는 발걸음에는 다른 희곡들이 궁금한 마음과 함께 실은 제 희곡을 보는 사람들을 보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사심이 꽤 섞여 있었다고 할까요. 부끄럽지만 저는 역시 조금 옹졸한 사람이기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태블릿을 받아들고 현장감상 장소의 문을 열었을 때. 바로 그때의 인상으로 2021년 현장감상을 오랫동안 기억하게 되었는데요, 어둡고 잔잔한 공간에서 각자의 태블릿으로 희곡을 읽는 사람들의 얼굴이 유독 하얗게 반짝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얼굴 외의 많은 것들이 아주 작게 사그라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누가 어떤 얼굴로 희곡을 읽는지를 떠올리며 희곡을 쓰게 되리라는 것을 예감했습니다.
2022년에도 연극in 희곡 공개모집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공개모집은 ‘다른 손(hands/guests)’, ‘다시 쓰기’. ‘자기만족충만’이라는 세 가지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새로워졌습니다. 총 33편의 현장감상 대상작이 선정되었는데요. 어느 초여름 저녁, 33편의 희곡을 얼른 만나고 싶은 마음을 안고 현장감상에 참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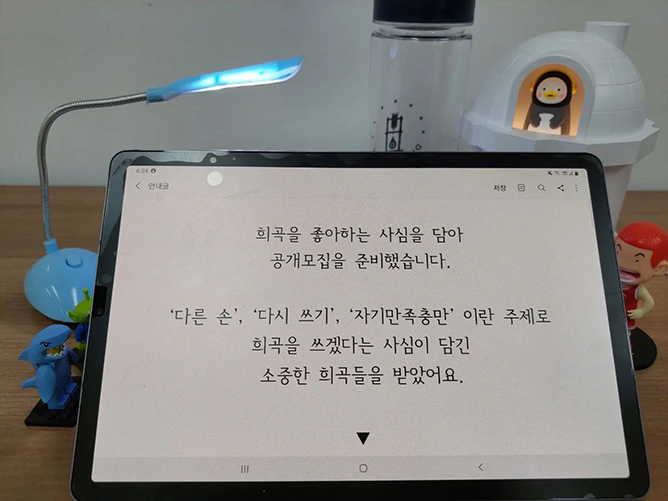
인간과 비인간 존재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지, 세계의 주변부에서 서로에게 어떻게 다정해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게 만드는 희곡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형식의 시도가 참신한 희곡이 늘어났다는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가상현실이나 SF적 요소를 사용할 경우, 어떤 현실이 이러한 상상을 가능하게 만들었는지를 되물었습니다. 작품마다 짧은 감상평을 작성할 수 있는 용지에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세세하게 채웠습니다.
작년에는 최종적으로 4편의 희곡을 고르는 데에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결과에 참여하는 것, 그로 인해 동료 작가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좋은 영향을 주고 싶어서 또 오랜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가진 생각과 고민이 동료 작가들에게 힘껏 연결되길 바라며, 밧줄을 던지는 마음으로 4편의 희곡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잠시 현장감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펜이 딸깍이는 소리. 빈백이 풀썩 내려앉는 소리. 텀블러에 음료를 따르는 소리. 그 소리 사이사이의 고요함 속에서 다들 어떤 사심을 갖고 여기에 왔는지 궁금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희곡만을 모아 볼 수 있는 자리는 굉장히 드뭅니다. 게다가 그 희곡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동시대 작가들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현장감상은 더욱 특별합니다. 현장감상에 참여하는 동안, 한 공간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지도 않고 각자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모두가 최선을 다해 희곡을 읽는 하나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낯선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사심을 드러내는 건 정말 나쁜 걸까요?
2022년의 저는 사심위원으로 연극in 희곡 공개모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작가들의 제안이었다는 얘기를 듣고 기쁘게 수락했지만, 모집된 94편의 희곡을 눈으로 확인한 순간 당황했습니다.
네? 94편이요? 머리를 쥐어뜯다 결심했습니다. 사심위원이니 사심에 충실하겠다고요.
저는 이야기가 조금 거칠더라도 누구에게 말을 거는지에 주목합니다. 말해야만 존재하는 이들에게 자리를 마련해주는 이야기와 미래를 좀 더 나은 곳으로 상상하고 만들어가는 힘을 가진 이야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과 현장감상에서 만났으면 하는 사심을 담아 현장감상 대상작을 선정했습니다.
동료 사심위원들과의 토론 과정에서 사심을 드러내는 일의 힘을 느꼈습니다. 다들 자신의 사심을 드러내며, 다른 이들의 사심과 만나게 하려 노력했습니다. 미처 이해하지 못한 내용이나 발견하지 못한 가능성은 없는지 조심스러워했고요. 그 과정에서 저도 최선을 다해 사심을 말하고 들어야 다양한 희곡을 현장감상에서 만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동료로서 해야 하는 일이 사심을 드러내는 일일 때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사심과 사심을 만나게 해 그 과정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를 귀 기울이는 일이야말로 노력이라는 단어에 어울릴지도 모릅니다. 33편의 현장감상 대상작을 선정하는 토론 중, 저의 사심을 드러낼 때는 94편의 희곡을 쓰는 동료 작가들과 그 희곡을 읽을 참여자들의 얼굴을 동시에 떠올려보곤 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 현장감상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낯선 안정감을 느꼈을 때.
모두는 어쩌면 사심으로 만난 사이일지도 모르고, 그러니 사심을 드러낸 건 꽤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심(謝心): 고맙게 여기는 마음
‘우리’라고 불러도 될까요?
2021년과 2022년, 작가와 사심위원으로 각기 다르게 참여한 현장감상이 왜 결국 만남에 대한 감각으로 연결되었는지를 돌이켜보면, 이 또한 저의 사심이지 않을까 합니다. 희곡을 쓰다 보면 지금의 쓰기가 이후의 읽기까지 연결되는지를 묻게 됩니다. 공연화까지 이어지는 희곡은 더욱 적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제 안의 힘이 모자랄 때 어디서 힘을 얻어야 할지 헤매기도 합니다.
현장감상의 경험은 저에게 헤맴에 대한 응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모여 희곡을 읽는 모습을 직접 볼 기회가 적었을 뿐, 지속적으로 희곡을 읽는 이들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게 된다면 수많은 희곡의 쓰기와 읽기에 영향을 줄 만큼 멋진 일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현장감상의 경험을 통해 결국엔 만나게 될 순간을 떠올리게 되니까요.

각자의 시간을 보내지만 결국엔 하나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서로 다른 사심을 드러내며 토론을 해내는 것이, 함께를 상상할 수 있는 시작점은 아닐까요? 희곡을 매개로 그런 상상을 구현해낼 수 있다면, 지금 어디에선가 희곡을 쓰고 읽는 서로를 ‘우리’라고 불러도 될까요?
힘껏 부딪혀서 미처 몰랐던 소리를 들려준 동료들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던 동료들도 떠오릅니다. 아마도 제가 사심을 갖거나 드러내길 주저해서가 아닐까 합니다. 모두에게 고마운 마음을 느낍니다. 만날 수 없었던 동료들, 앞으로 만나게 될 동료들. 저는 저의 사심을 계속해서 가질 테니, 당신도 당신의 사심을 계속해서 가져달라는 부탁을 해도 될까요?
그래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심과 사심이 만나는 순간을 고대합니다. 그때의 우리 얼굴이 얼마나 빛날 수 있을지, 저는 알고 싶습니다. 

- 전서아
-
연극 <이사공 이사오(240 245)>, <커튼>, <오르막길의 평화맨션> 등을 썼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쓸 수 있을지, 가만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jeonseoa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