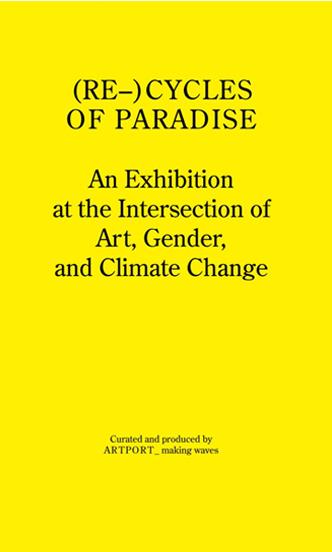예술이 ‘여전히’ 급진적이어야 할 이유
[연극과 지구: 모두를 위한 연극] 첫 번째 기사
유현주_생태미학예술연구소대표
제180호
2020.06.04
연극in은 연극과 지구 환경을 주제로 총 5회에 걸쳐 기획연재를 시작합니다. 환경의 변화로 인한 기후위기가 우리 모두의 현재와 미래를 좌우할 긴급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목소리를 모으고 있는 예술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로 지금, 우리의 창작과 관람 환경을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기후위기와 밀접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은 연극인으로서 우리와 지구의 관계를 돌아보게 합니다. 연극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연극은 어떤 모습으로 이 시절을 보내야 할까요? 연극in은 이번 기획을 통해 지구 환경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예술계 현장의 현재 모습을 살피며, 앞으로 어떠한 실천을 시작할 수 있을지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코펜하겐으로부터 한 장의 전시 리플렛이 필자에게 날아왔던 것은 그곳에서 기후회의가 열리던 2009년 겨울이었다. 이 전시는 ‘천국의 (재)순환 (Re-)Cycles of Paradise’이란 제목으로 기후변화와 젠더 문제를 연결하는 에코페미니즘을 다루고 있었다. 기후변화 전시를 기획하고 제작해온 단체인 ‘ARTPORT_making waves’는 전시회, 교육프로그램, 영상프로젝트, 지속가능성 및 기업책임컨설팅은 물론 예술, 과학, 정치 등을 연계한 협업을 통해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고양해온 국제 큐레이터 그룹이다. 이들이 기획한 이 전시는 여성과 자연을 착취해온 사회를 비판하고 자본이 빚어온 기후변화의 사태를 은유적으로 풀어낸다. 전시된 작품 중 독일작가 인사 빙클러(Insa Winkler)의 <(비)의존성의 물 (IN)dependency water>은 두 개의 대조적인 설치물로 구성된 것인데, 한쪽에는 물 부족 국가인 아프리카 여성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있는 모습(물이 흐르는 파이프를 여러 개 세워 설치한 여성의 형상)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생수병으로 이루어진 포도나무 넝쿨 즉 ‘생수병이 자연이 된’ 풍경이 그려진다. 이러한 풍경 이면에 ‘물, 여성의 노동, 자본화된 자연과 기후변화’에 관한 질문들이 내재해 있음을 알아차리기는 어렵지 않다.
(사진 출처: ‘천국의 (재)순환 (Re-)Cycles of Paradise’ 카탈로그 캡처)
그런데 왜 오늘날의 예술은 생태계와 환경문제에 유례없는 관심을 보이는 것일까? 도대체 이 행성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이기에 예술가들이 발 벗고 나서는 것일까? 생태 위기는 이미 경고 수준을 넘어섰다. 북극과 남극의 빙하도 빠른 속도로 녹고 있지만, 적도 인근의 빙하는 이런 속도라면 10년 이내에 사라진다는 것, 그리고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실패하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50년 안에 연평균 기온 29도를 넘는 사하라 사막과 같은 불볕더위에서 살게 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게다가 현재 1만 7천 종의 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으며, 지구상에서 절대 사라지면 안 될 다섯 가지 생물종(식물성 플랑크톤, 영장류, 균류, 벌, 박쥐)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에 따르면, 박쥐에 기생하는 박테리아가 기후변화 위기에 반응하면서 새로운 서식처를 찾아 이동 경로를 찾는 중인데 이는 현재의 코로나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고 한다.
‘지속가능한 천국’이 되길 소원하는 ‘ARTPORT_making waves’에 참여한 예술가들을 보통 생태예술가들로 칭하지만, 실은 더 광범위하게 많은 동시대 예술가들이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고민을 풀어내는 것에 작업의 초점을 두어왔다.
특히, 20세기 들어와 예술이 게릴라부대처럼 어떤 행동/수행/실천을 통해서 현실에 개입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1985년 뉴욕에서 여성미술가 그룹인 ‘게릴라 걸스’가 고릴라 가면을 쓰고 거리를 활보하거나 시위함으로써 젠더 문제를 제기했던 것과 유사한 맥락에서, 90년대 이후의 예술은 60, 70년대의 대지예술이나 어스워크(earthwork)작업들이 대지를 캔버스 삼아 미적인 작업을 하는 차원을 넘어 생태적·정치적 이슈를 제기한다. 그러나 그 방법은 실질적이면서도 미학적이다. 예컨대 예술가가 실제 오염된 지역에서 물리적 개입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에코벤션(ecovention: eco+intervention)을 시도할 때 과학자 등 미술 외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요청하는 등 현실적인 접근을 취하면서도, 작업의 형식은 기후변화 문제를 예술 언어-미적, 상징적, 은유적-의 방식으로 풀어내는 미학적 기준점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15년 아비바 라마니(Aviva Rahmani)의 <푸르러진 나무들의 교향곡 Blued Trees Symphony>은 미국 뉴욕주의 픽스킬(Peekskill)에서 출발해 약 130마일을 따라 송유관이 매설될 일대의 숲에서 진행된 작업이다. 작가는 작업의 참여자들과 함께 이끼를 자라게 하는 무독성의 파란색 물감을 나무들에 칠하며 합창하는 퍼포먼스를 숲의 1/3 지점마다 진행했다. 이 나무 교향곡은 2017년 한국화학연구원이 주최하고 필자가 기획한 전시 ‘화성에서 온 메시지_기후변화대응 화학예술특별전’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미국의 숲에서 울렸던 그 사운드는 한국의 전시장에서 작가가 녹음한 새소리와 자연음으로 되울렸고, 그 풍경은 천정에 걸린 파란색 물감이 칠해진 나무숲으로 이어졌다. 지구 해수면이 상승한 이후 한반도를 비롯해 여러 섬 국가들이 물에 잠긴 세계 지도가 전시장 벽면에서 그 나무숲의 배경이 되어주었다. 지도에 점으로 표시된 지역들은 레퓨지아(Refugia: 과거에는 광범위하게 분포했던 유기체가 소규모의 제한된 집단으로 생존하는 지역)를 가리키는데, 이 푸른 점들은 지구가 만약 서식처를 모두 잃을 경우에도 유일하게 생물종들이 생존할 주요 거점을 가리킨다. 화석연료 사용에 반대하며 자연과 우리의 삶이 공존해야 함을 노래한 이 프로젝트는 작가가 저작권 소송을 걸어서 화석연료에 맞서 숲을 보호하고자 하는 행동주의 작업으로 지금도 유명하다.
‘지속가능한 천국’이 되길 소원하는 ‘ARTPORT_making waves’에 참여한 예술가들을 보통 생태예술가들로 칭하지만, 실은 더 광범위하게 많은 동시대 예술가들이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고민을 풀어내는 것에 작업의 초점을 두어왔다.
특히, 20세기 들어와 예술이 게릴라부대처럼 어떤 행동/수행/실천을 통해서 현실에 개입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1985년 뉴욕에서 여성미술가 그룹인 ‘게릴라 걸스’가 고릴라 가면을 쓰고 거리를 활보하거나 시위함으로써 젠더 문제를 제기했던 것과 유사한 맥락에서, 90년대 이후의 예술은 60, 70년대의 대지예술이나 어스워크(earthwork)작업들이 대지를 캔버스 삼아 미적인 작업을 하는 차원을 넘어 생태적·정치적 이슈를 제기한다. 그러나 그 방법은 실질적이면서도 미학적이다. 예컨대 예술가가 실제 오염된 지역에서 물리적 개입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에코벤션(ecovention: eco+intervention)을 시도할 때 과학자 등 미술 외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요청하는 등 현실적인 접근을 취하면서도, 작업의 형식은 기후변화 문제를 예술 언어-미적, 상징적, 은유적-의 방식으로 풀어내는 미학적 기준점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15년 아비바 라마니(Aviva Rahmani)의 <푸르러진 나무들의 교향곡 Blued Trees Symphony>은 미국 뉴욕주의 픽스킬(Peekskill)에서 출발해 약 130마일을 따라 송유관이 매설될 일대의 숲에서 진행된 작업이다. 작가는 작업의 참여자들과 함께 이끼를 자라게 하는 무독성의 파란색 물감을 나무들에 칠하며 합창하는 퍼포먼스를 숲의 1/3 지점마다 진행했다. 이 나무 교향곡은 2017년 한국화학연구원이 주최하고 필자가 기획한 전시 ‘화성에서 온 메시지_기후변화대응 화학예술특별전’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미국의 숲에서 울렸던 그 사운드는 한국의 전시장에서 작가가 녹음한 새소리와 자연음으로 되울렸고, 그 풍경은 천정에 걸린 파란색 물감이 칠해진 나무숲으로 이어졌다. 지구 해수면이 상승한 이후 한반도를 비롯해 여러 섬 국가들이 물에 잠긴 세계 지도가 전시장 벽면에서 그 나무숲의 배경이 되어주었다. 지도에 점으로 표시된 지역들은 레퓨지아(Refugia: 과거에는 광범위하게 분포했던 유기체가 소규모의 제한된 집단으로 생존하는 지역)를 가리키는데, 이 푸른 점들은 지구가 만약 서식처를 모두 잃을 경우에도 유일하게 생물종들이 생존할 주요 거점을 가리킨다. 화석연료 사용에 반대하며 자연과 우리의 삶이 공존해야 함을 노래한 이 프로젝트는 작가가 저작권 소송을 걸어서 화석연료에 맞서 숲을 보호하고자 하는 행동주의 작업으로 지금도 유명하다.

아비바 라마니 <푸르러진 나무들의 교향곡 Blued Trees Symphony>의 나무들
(사진 출처: ghostnets.com ⓒAviva Rahmani)
한편, 환경을 더럽히거나 탄소 발자국을 크게 남기는 예술은 비호감으로 여겨진다. 미국 네바다주 사막에 폭발물을 사용해 만들어진 인공의 협곡에서 관람자들이 걷는 체험을 하게 한 대지예술가 마이클 하이저(Michael Heizer)의 <더블 네거티브 Double Negative>(1969)는 그 엄청난 규모에서 숭고의 체험을 주기도 하지만, 환경에 대한 파괴적 행위 때문에 비난을 받기도 한다. 미적 체험을 위해 인위적으로 공간을 창조하는 것(파괴적으로)에 이전에는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으나, 이제는 많은 사람이 불편함을 느낀다.
자연을 파괴하거나 변형시키지 않으면서 자연물로 작업을 하고 그것을 다시 자연에 돌려보내는 작업도 있지만, 기후변화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예술작업이 단지 예술이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 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쳐도 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꽃이 때로 예술가의 천재성을 드러내기도 하고 시장에서 높은 가치로 인정받기도 하지만, 넓게 보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의 조건 속에서만 꽃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미술평론가 수지 가블릭은 “우리가 자연과의 공생적 관계를 각성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긴급한 영적이고 정치적인 과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삶과 예술의 간극을 더욱 넓히고 있는 미디어 스캔들과 센세이셔널리즘을 생산하는 현재의 제도를 벗어나고자 하는 예술들은 그런 점에서 급진적이다. 1960년대 대지예술이 상품으로 교환할 수 없고 미술관으로 진입할 수 없는 예술을 선보였을 때 그리고 소음도 예술이라고 일컬었던 존 케이지의 음표 없는 악보가 등장했을 때 예술이 예술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급진적 궤도에 진입했다고 한다면, 기후변화를 자신의 실존적 삶으로 연결하고 이를 대중과 함께 행동으로 옮기는 태도를 취하는 예술 역시 시대의 급진성을 띠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예술이 이제 무엇인지를 새롭게 규정하는 패러다임의 이동이며, 예술작품이 과연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묻는 가치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기도 하다.
21세기 예술은 이제 전통적 예술생산에서 인간과 비-인간 자연공동체의 더 큰 맥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다. 왜냐하면 자연과 문화가 분리된 것이 아님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지구라는 에코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가족 즉 오이코스(Oikos)이기 때문이다.
자연을 파괴하거나 변형시키지 않으면서 자연물로 작업을 하고 그것을 다시 자연에 돌려보내는 작업도 있지만, 기후변화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예술작업이 단지 예술이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 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쳐도 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꽃이 때로 예술가의 천재성을 드러내기도 하고 시장에서 높은 가치로 인정받기도 하지만, 넓게 보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의 조건 속에서만 꽃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미술평론가 수지 가블릭은 “우리가 자연과의 공생적 관계를 각성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긴급한 영적이고 정치적인 과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삶과 예술의 간극을 더욱 넓히고 있는 미디어 스캔들과 센세이셔널리즘을 생산하는 현재의 제도를 벗어나고자 하는 예술들은 그런 점에서 급진적이다. 1960년대 대지예술이 상품으로 교환할 수 없고 미술관으로 진입할 수 없는 예술을 선보였을 때 그리고 소음도 예술이라고 일컬었던 존 케이지의 음표 없는 악보가 등장했을 때 예술이 예술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급진적 궤도에 진입했다고 한다면, 기후변화를 자신의 실존적 삶으로 연결하고 이를 대중과 함께 행동으로 옮기는 태도를 취하는 예술 역시 시대의 급진성을 띠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예술이 이제 무엇인지를 새롭게 규정하는 패러다임의 이동이며, 예술작품이 과연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묻는 가치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기도 하다.
21세기 예술은 이제 전통적 예술생산에서 인간과 비-인간 자연공동체의 더 큰 맥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다. 왜냐하면 자연과 문화가 분리된 것이 아님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지구라는 에코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가족 즉 오이코스(Oikos)이기 때문이다.

- 유현주 생태미학예술연구소대표
- 홍익대 미학과에서 <아도르노 미학에서의 기술(Technik)>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홍익대와 한남대 등에서 미학과 미술이론을 가르쳤고, 2013년부터 생태미학예술연구소를 설립하고 '생태, 자연, 젠더, 도시' 등을 키워드로 한 전시기획을 했다. 2017년 한국화학연구원 초대로 기후변화 대응 화학예술특별전 기획과 전시감독을 맡았다. 저서로 <대중문화와 미술, 수백 개의 마릴린 먼로와 수천 개의 모나리자>(2014)와 엮은 책으로 <인공지능시대의 예술>(2019)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