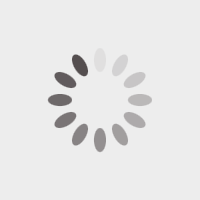구부리고 비틀고 찢고 다시 짜고
작당모의 2024 <그물> 미리보기
성수연(요다)
제259호
2024.08.08
판소리 <심청전>은 생각보다 죽음에 가까운 이야기이다. 어릴 적 읽은 전래동화에서 인당수에 뛰어든 심청이 용궁에 도착해 연꽃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남아 있어서 그렇지, 사실 한 사람이 인제로 바쳐져 죽는 이야기다. 심청이 인당수에 몸을 던질 때는 용궁에 대한 믿음이나 살 것이라는 확신 같은 건 없었을 테다.
구부리기
작당모의의 <그물>은 심청을 인당수로 데려가는 남경장사 선인들의 배 위에서 시작된다. 지하 연습실, 흰 페인트가 벗겨져 가는 빈 공간에 흰 저고리와 바지를 입은 배우가 등장한다. 벽에 기대어있던 합판을 바닥에 내려놓더니 사람 키보다 큰 그것을 세워 한 쪽은 발로 바닥에 고정하고 한 쪽은 손으로 잡아 구부린다. 구부러진 합판과 천천히 춤을 추듯 빙글, 빙글 돈다. 또 한 명의 배우가 등장해 이번에는 말을 얹는다. “만 이랑 푸른 파도 위”라는 말에 구부러진 합판의 옆 곡선은 돛을 단 배가 된다. 입으로 만들어내는 바닷바람과 철썩대는 파도소리에 배는 앞으로 나아간다.
두 명의 배우가 두 장의 합판과 몇 가지 소도구로 만들어내는 이야기에 빠져들다 보면 익숙한 장면들이 하나둘 떠오른다. 합판 위에 올라 그 가장자리 너머로는 바닥이 안 보이는 검은 물인 양 내려다보는 심청과 합판의 끄트머리가 노인 양 끼익, 끼익 입소리를 내며 젓는 남경장사 선인. 스테인리스 대야의 챙챙거리는 소리는 인당수에 도착해 때가 됐다며 심청을 몰아세우는 굿 소리다. 죽음이 다가오는 소리와 흔들리는 뱃전에 심청이 휘청거린다. 물속으로 뛰어내린 심청이었던 배우의 몸은, 그 자리에서 한 박자 늦게 그를 잡으려 손을 내민 선인이 된다.
더 나아갈 것 같은 연극은 심청이 인당수에 뛰어든 시점에서 멈춘다. 인당수로 점점 깊이 들어가는 심청을 중심으로 시간이 휘고 공간이 구부러진다. 구부러진 시공 사이로 틈이 보인다. 틈 사이로 과거가 뽀글뽀글 기포처럼 올라온다. 무엇이 심청을 인당수에 빠지게 만들었는가. 심학규가 개울을 건너다가 넘어진 사건이었을까, 목숨을 살려준 값으로 몽운사에 공양미 삼백 석을 시주하라는 화주승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 탓일까, 아니면 더 과거에 심청의 어머니 곽 씨 부인의 죽음부터였을까.

비틀기
구부러진 것은 이내 비틀린다. 연극도 판소리 <심청전>에서 약간씩 비틀린다. 귀덕어멈은 곽 씨 부인이 죽을 때 침상을 지킨 소꿉친구이다. 귀덕과 심청을 함께 젖 물려 키운 귀덕어멈은 이번에도 심청을 돕기 위해 윗동네 아랫동네를 돌아다니며 십시일반 쌀을 모은다. 동냥은 받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여 말로 버는 일이다. 동네 사람들은 쌀을 내어주는 것이 심청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귀덕어멈을 보아서라고 한다. 심청과 심학규를 근심과 걱정으로 몰아놓은 것이 화주승의 말이라면 그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은 귀덕어멈의 말이다.
하지만 심청은 귀덕어멈이 모은 공양미 삼백 석을 받지 않는다. 귀덕어멈의 말재주 덕에 없던 삼백 석이 생겼지만 그 삼백 석이 애초에 정말 있어도 되는 걸까? 허구인 것에 대해 실재로 대응하면 정말로 허구인 것이 실재가 되어버린다. 아버지인 심학규의 목숨을 구해준 대신 부처님께 쌀 삼백 석을 시주하라는 몽운사 화주승의 혀 놀림 한 번에 난데없이 쌀 삼백 석이 생겨났다. 그리고 귀덕어멈의 도움으로 있으면 안 될 삼백 석이 실제로 나타났다고 한들 그게 이치에 맞을 리 없다. 그렇게 해결할만한 문제가 아니다. 허구인 것에는 허구인 것으로 받아쳐야 한다.
판소리 <심청전>에서도 심청의 고집은 이상하리만큼 세다. 꼭 자진해서 죽음으로 뛰어드는 사람 같다. 원작에서 심청은 아버지 심학규가 눈을 뜰 수 있다면 스스로 인당수에 뛰어들어서라도 공양미 삼백 석을 마련하려고 한다. 이는 단순히 효심 때문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하면 심청을 딸처럼 여긴 장 승상 댁 부인이 수양딸로 들어오는 대신 쌀 삼백 석을 내어주겠다고 한 제안을 받고 심청 또한 심학규 곁에 남는 편이 현실적일 것이다. 하지만 심청은 이제 와서 남경장사 선인들과의 거래를 무를 수 없다고 한다.1) 원작에서도 죽으려고 작정한 듯한 심청의 태도는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그 명령의 부당성을 드러내는 항의”2)이거나 “피할 수 없이 닥쳐온 ‘운명’을 받아들이며 자신이 속한 세계를 과감하게 떠나 다른 세계로 들어가려는 결단”3)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판소리 <심청전>에서 심청이 인당수에 몸을 던진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무엇을 위해 그랬는지 그의 의중은 알기 어렵다.

찢기
하지만 <그물>에서 심청은 애초에 죽을 계획이 없다. 왜 죽어야 하는가. 처음부터 그건 선택지에도 없다. 그렇다고 화주승의 말 한마디로 생겨난 공양미 삼백 석을 동냥으로 해결하고 싶지도 않다. 하지만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심보는 아니다.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면 나를 바꾸지 않음으로써 세상이 내 주위로 구부러지고 휘게 해야지 하는 결단이다. 물의 방향이 바뀌는 울돌목은 바다가 운다고 해서 울돌목이다. 그건 “물의 방향을 바꾸려고 애쓰며” 우는 소리이다.
천라지망4), 하늘도 땅도 그를 가두는 그물이다. 이런 상황에서 심청은 그물을 찢는다. 심학규가 방 안에 앉아서 짜 내려간 그물을 남경장수 선인들에게 주며 자신이 인당수에 빠진 뒤에 던져 달라고 한다. ‘제갈공명이 인제 대신 사람 머리 모양의 만두를 던졌듯’ 사람을 바쳤으면 됐지, 바친 사람을 다시 구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렇게 심청은 자진해서 바다 속을 두 쪽으로 찢고 내려간다. <그물>의 심청은 판소리 <심청전>의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갈 생각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구부리고 비틀고 반으로 찢어버린다. 인당수로 향한 배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남경장사 선인들이 던진 그물을 잡고 인당수에서 나온 심청이 새로운 항해를 떠나는 곳에서 끝난다.
심학규는 꿈에서 청이 수레를 타고 떠나는 것을 본다. 그는 귀한 사람만 수레를 탄다는 말로 불길함을 달래보지만, 그것이 상여인지 꽃가마인지 알 길이 없다. <그물>의 심청의 머릿속에도 죽음에 대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른다. 그러기엔 그는 너무 침착하고 호기로운 심청이지만. 스키점프 자세를 하고 기세로 덤비는 심청이지만. 그물을 붙잡고 다시 올라오는 터미네이터 심청이지만. 말도 안 되는 세상의 법칙에는 따를 생각 없으니 세상이 알아서 휘고 구부러지라는 태도는 죽음을 생각한 뒤에 올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심청 주위로 그물은 구부러지고, 비틀리고, 마침내 찢어지고 다시 짜였다.

[사진 촬영: 박태준]
- 일자 2024.7.24 ~ 8.4
- 장소 없던 극장 (서울 송파구 마천로 127, 지하)
- 작·연출 김풍년 출연 김계남, 최필규 안무 금배섭 음악 옴브레 조명 정유석 사진영상 박태준 기획 신재윤
- 관련정보 https://www.facebook.com/share/p/DJhN8RXcBD1cJfor/
- “또한 위친하여 공을 빌 양이면, 어찌 남의 무명색한 재물을 빌려오며, 백미 삼백 석을 도로 내어주면 선인들 임시 낭패오니, 그도 또한 어렵사옵니다.” (작자 미상, 최운식 옮김, 『심쳥젼』, 지식을만드는지식, 2013)
- 이진경, 『파격의 고전』, 글항아리, 2016, 36쪽.
- 같은 책. 41쪽.
- 천라지망(天羅地網) 하늘에 새 그물, 땅에 고기 그물이라는 뜻으로, 아무리 하여도 벗어나기 어려운 경계망이나 피할 수 없는 재액을 이르는 말. 표준국어대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