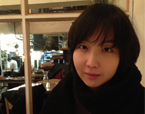극장, 사라짐과 기억에 대해 사유하다
극단 맘앤집시
김나볏_공연칼럼니스트
제110호
2017.02.23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어떤 존재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한다. ‘사라짐’, 다시 말해 ‘있다가 없는 것’을 처음 겪었을 때 대개 감정은 통제 불가능한 듯 요동치기 마련이다. 그리고 마음속엔 결코 영영 지워지지 않을 것만 같은 깊은 스크래치가 남기도 한다. 그런데 존재의 사라짐에 대한 경험은 한 번이 아니라 이따금씩 우리를 찾아온다. 크게 또는 작게, 멀리서 혹은 가까이에서, 우리는 무언가가 사라지는 것을 반복해서 겪는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문득, 사라짐 그 자체에 오래, 깊게 집중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사라짐에 무뎌진다고나 할까. 세상은 이 무뎌짐을 두고 그저 무덤덤하게 어른이 되는 과정이라 말한다.
<점과 점을, 잇는 선. 으로 이루어진, 육면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몇 개나 되는. 서로 다른, 세계. 그리고 빛에 대해.>. 구두점에 따라 속도를 찬찬히 조절해가며 목소리로 따라 읽다보면 기하학적인 이미지를 한번쯤 머릿속에 그려 보게 되는, 길고 희한한 제목의 연극 한 편이 무대에 오른다. 연출가 겸 극작가 후지타 다카히로가 이끄는 일본 극단 맘앤집시의 2013년도 작이다. 2007년에 극단을 창립하고, 2012년 기시다 구니오 희곡상을 수상한 이후 일본은 물론 해외 무대에서도 종횡무진 활동 중인 후지타 다카히로의 첫 한국 공연이기도 하다. 후지타 다카히로는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사건으로 현대사회의 문제와 삶을 표현하는 이른바 ‘제로세대’의 가장 젊은 주자로 불린다. 제목에서 일부 힌트를 얻을 수 있듯, 이 연극은 잡힐 듯 말 듯한 상념을 섬세하고 침착하게 무대 위에 움직임으로 포착하며 관객을 ‘사라짐’과 ‘기억’에 대한 사유로 이끄는 작품이다.

우리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걸까?
2001년 도호쿠 지역에서 학교에 다니는 여섯 명의 중3 소년, 소녀가 있다. 매일 학교와 집을 오가며 이렇다 할 사건 없이 지내던 중, 무리 중 한 명인 아야가 가출을 감행한다. 친구들은 아야가 가출한 이유를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숲 속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하는 아야를 찾아 돌아오게 하기 위한 작전을 짠다. 한적한 동네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을 겪고, 9.11을 간접 체험하고, 아야의 가출을 접하면서 아이들은 어른들이 만들고 자신들도 흡수되어 가는 이 세계에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2011년 어느 날, 중학교 졸업과 함께 여섯 명의 세계는 모두 달라져 있다. 남은 친구들은 지진과 쓰나미가 덮친 학교를 다시 찾아 10년 전의 기억을 되살린다.
작가는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춘기 중학생들을 무대로 불러낸다. 마치 일본 만화의 학원물을 연상시키는 듯한 이들 인물은 극 속에서 세상의 오류를 예민하게 감지해내는 일종의 리트머스지 같은 역할을 한다. 어른도 아이도 아닌, 경계인으로서 존재하는 이들은 어렴풋이나마 자신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눈치 챈다. 감당하기 힘든 사회적 재앙들이 하나둘 자신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누군가의 존재가 자꾸만 지워져간다는 사실을 말이다.
가장 먼저 빠르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인물은 아야다. 2001년, 동네에서 벌어진 잔혹한 살인사건에 대해 아야는 이상하다고 느낀다. 그 이상한 감정은 다름 아닌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서 비롯된 것이다. 잔혹한 사건을 너무나 빠르게 잊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살아가는 동네 사람들을 향해 마치 투쟁이라도 하듯, 아야는 학교와 가정을 뛰쳐나와 텐트를 치고 비박을 하며 산에 머문다. 또 다른 인물들인 아유미와 오노시마가 TV 속 화면에서 9.11 테러를 목격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때쯤이다. 이들은 비록 아야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9.11 테러라는 충격적이고 비현실적인 비극적 사건을 ‘육면체’의 TV를 통해 목격한 다음날에도 ‘육면체’ 꼴인 학교를 향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진자 운동하듯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자신들의 처지에 대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학교라는 ‘육면체’ 안에 갇혀있던 또 다른 세계들인 나머지 극 중 인물들, 즉 하사타니, 지츠코, 사토코 또한 각자의 삶 속에서 서로 다르면서도 비슷한 깨달음을 축적해 가며 성장통을 겪는다.

연극과 극장에 대한 비유
그렇게 인물들은 각자의 리듬과 호흡에 맞춰 ‘점과 점을, 잇는 선. 으로 이루어진, 육면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몇 개나 되는. 서로 다른, 세계. 그리고 빛에 대해.’ 생각한다. 무대는 간단하지만 꽤나 흥미로운 모양새를 하고 있다. 무대 뒤편에 스크린을 통해서는 외부 환경을 상징하는 간단한 이미지들이 이따금씩 투영된다. 시선을 바닥으로 돌리면 이리저리 얽혀 그려져 있는, 점과 점을 이은 선들이 포착된다. 이곳에서 배우들은 각각의 선을 따라 때때로 움직이며 반복되는 일상의 리듬을 표현해낸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아야의 미니 사이즈 텐트가 놓여 있다. 즉 전체적으로 사실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모듈과도 같은 느낌을 자아내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소개한 대로 극이 다루는 줄거리는 비교적 명확한 편이다. 그러나 내용을 담은 장면이나 대화 등이 시간 순으로 배치되지 않을뿐더러 특정 장면의 경우 여러 번 다양하게 반복되기 때문에 관객 입장에서는 단순히 줄거리를 전달 받는 것 이상의, 색다른 극적 경험이 가능하다. 상징적 장면을 다양한 각도에서 반복하는, 이른바 후지타 다카이로 표 '후렴' 연출과 극작 방식이 빛을 발하는 대목이다. 공연은 만나고 헤어지는 것,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것이 비단 개인적 차원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계속 벌어지고 있음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함으로써 마치 우리에게 공감 능력의 확장을 종용하는 듯하다.
연극 <점과 점을, 잇는 선. 으로 이루어진, 육면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몇 개나 되는. 서로 다른, 세계. 그리고 빛에 대해.>에서 극장이란 다름 아닌 삶 속에서 잊기 힘든, 잊기 싫은, 잊어서는 안 될 강렬한 장면들을 반복하며 희망의 실마리를 발견해내는 공간이 아닐까 싶다. 그곳에서 배우들 각각의 움직임은 아마도 ‘육면체 극장.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몇 개나 되는. 서로 다른, 세계.’ 그 자체일 것이다. 작가는 비극적 세계를 종종 마주하게 되는 우리가 삶 속에서 큰 생채기를 내며 사라지는 것들을 기억하는 행위, 그 자체가 어쩌면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설파하려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사진: 극단 맘앤집시 제공]

- 일정
- 2월 25~26일, 토 3시8시, 일 1시5시
- 장소
- 서강대 메리홀 소극장
- 작·연출
- 후지타 다카히로
- 번역
- 고주영
- 출연
- 오기와라 아야, 오노시마 신타로, 나리타 아유미, 하사타니 사토시, 메스다 지츠코, 요시다 사토코
- 문의
- pocketpaperseou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