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4화 중간지대
1
 2020년 8월 P의 예언-이미지 첫번째.
2020년 8월 P의 예언-이미지 첫번째.
쌍둥이의 이야기는 이틀 뒤에야 진우에게 도착했다. 그는 되풀이하여 물었다. 납치, 납치라고요? 직원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했다. 그걸 납치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획된 도주 같다고 해야 할지……
쌍둥이를 생각하지 않아도 삶은 문제없이 굴러갔다. 지난 이십 년 간 이름으로만 알아온 존재들이었다. 그들의 부재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누구도 그들을 모른다. 이름조차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다. 그들이 태어난 나라에서도, 한국에서도.
그럼에도 종종 속이 거북했다. 작은 손이 배 안쪽을 긁는 듯했다. 직원이 말했던 여자에 대한 생각도 떠나질 않았다.
그 여자.
진우는 이틀 간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여자가 대기실에 제출한 서류를 모조리 읽고, 여자를 만난 직원의 이야기를 들었다. 새벽빛이 밝아올 즈음에 확신했다. 사민이다. 사민이 그들을 데려갔다. 어떻게 쌍둥이를 발견하고, 왜 그들을 데려갔는지 어느 하나 명확한 게 없었다. 여자가 사민이라는 사실만이 분명했다. 진우는 오래 묵힌 연락처들로 전화를 걸었다. 그는 여전히 사민의 이름만으로도 끓어오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았다.
며칠이 지나도 일과 란의 소식은 없었다. 진우는 동요하지 않았다. 쌍둥이는 잘 있을 것이다. 그들 자신이 납치당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그는 사민의 방식을 알았다.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굴러간다고 느끼는 순간 주도권을 빼앗는.
그럼에도 그들은 대체 어디에 있을까? 사민의 차를 추적하기란 불가능했다. 비서는 난감한 얼굴로 말했다. 애초에 일과 란이라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으므로, 납치의 여부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진우는 목을 길게 폈다. 인내심이 필요했다. 그는 그런 일에 능했다. 사방을 살피고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는 일. 오래 전 아시아의 왕들은 왕관 위에 새들을 올려두었다. 새들은 목을 곧추세운 채 주위를 살폈다. 적들이 다가오면 큰 소리로 짖었다. 언제나 진우는 자신이 왕보다, 왕관 위에 놓인 새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이번에는 무엇이든―그게 비록 자신에게 온갖 곤란함을 안겨다주더라도―사민이 가져가게 두지 않겠다. 그는 여러 차례 되뇌었다.
그해 장마는 이르게 시작하여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밤낮으로 묵직한 공기가 그를 억눌렀다. 마침내 해가 뜬 날, 한 통의 전화가 왔다. 발신자 제한 번호였다.
―우리 좀 데리러 와줘요.
건너편에서 란이 말했다.
 2020년 8월 P의 예언-이미지 두번째.
2020년 8월 P의 예언-이미지 두번째.
쌍둥이는 텅 빈 공사장 한가운데 서 있었다. 반쯤 세워진, 혹은 반만 허물어진 건물 앞이었다. 그들은 좋아 보였다. 얼굴에 살이 오르고, 머리카락에 윤이 돌았다. 그들은 진우의 차가 방지 턱을 뛰어넘어 달려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진우가 창을 내렸다.
―정말로 걱정 많이 했어.
란과 일은 뒷좌석에 탔다. 진우는 룸미러로 몇 차례나 그들을 살폈다. 쌍둥이는 말이 없었다. 차만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폐허를 떠났다. 고속도로에 올라탔을 때, 진우는 물었다.
―이름은 들었어?
일이 고개를 저었다. 란은 창밖만 바라보았다. 진우가 속삭였다.
―그 여자의 이름은 사민이야.
쌍둥이들은 룸미러를 보았다. 그 안에 비친 진우의 얼굴이 새빨갰다. 이마는 땀으로 번들거렸다.
―본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해 전까지 함께 일했어.
그들은 지하에서 함께 머물렀다. 진우는 그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연구소’라고 부르지만,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지하실’이라고 호칭하던 곳이었다. 밤낮으로 거대한 컴퓨터를 돌려야 했으므로 항시 추웠다. 천장과 벽에서는 늘 물소리가 들렸다. 직원들은 여름에도 두툼한 옷을 걸치고 일했다.
그들은 매일 정보들을 끌어 모았다. 활자와 사진, 영상, 녹취본,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뉴스부터 몇십 년 전 신문들의 기록들을 수집했다. 그들끼리는 “신전을 짓는다”고 불렀다. 과거를 갖고 미래를 짓는 일이라고들 했다. 거창한 표현이었으나, 틀린 말은 아니었다. 기록과 계보를 오래 들여다보면 몇 가지의 미래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그뿐이면 충분하다. 무너지는 건물들을 복구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난 그렇게 믿었다.
진우는 말했다. 비슷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한곳에 모여서 일했다고. 본인들의 사리사욕일랑 없다는 양, 밤낮으로 지하실에 눌러앉았다.
사민은 수석 연구원이었다. 밤낮으로 돌아가는 컴퓨터를 제외하면, 연구소에서 사민보다 더 긴 시간 일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관사와 연구소만을 오가며 데이터를 모았다. 마지막에는 그 모든 것을 갖고 사라졌다. 신전의 기둥과 지붕, 제단 중 어느 것도 남기지 않았다. 나는 그 사람을 믿었어. 진우가 말했다.
―내가 만난 가장 끔찍한 사기꾼이야.
그는 고개를 돌렸다. 쌍둥이들의 얼굴이 새파랬다. 속이 안 좋으니 좀 내려줘요. 그들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2020년 8월 P의 예언-이미지 세번째.
2020년 8월 P의 예언-이미지 세번째.
한강은 서울보다도 먼저 시작되었다. 그들은 강변에 앉았다. 서울로 향하는 물결들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무수한 빛들이 흘러갔다.
일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담담한 목소리로, 사민을 만난 첫날을 묘사했다. 도중에 란이 끼어들었다. 나중에는 두 사람 다 동시에 말하거나, 말할 순번을 정하기 위해 소리를 지르며 다퉜다. 진우는 가만히 있었다. 그들을 말릴 생각은 없었다. 쌍둥이의 울분은 커다랗고 오래된 듯 보였다. 그것을 깨부수는 순간을 방해하다가는, 그들이 다시는 자신을 믿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여러 차례 불신을 쌓아놓은 터였다.
쌍둥이는 자신이 지낸 도시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 열흘 내내, 사민이 마련해둔 집에서만 지냈다. 사민은 저녁마다 왔다. 양손마다 음식과 옷가지를 가득 들고.
―아주 새집이었어요, 빈 아파트. 방 세 개와 화장실 두 개.
꿈에서나 바랄 법한 집이었다. 수도꼭지를 돌리면 언제든 물이 나왔다. 일과 란은 처음으로 각방을 쓸 수 있었다. 한 달 정도를 숨어 지내다가, 여자와 함께 통로를 살피기로 했다. 쌍둥이는 번갈아 말했다. 여기서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통로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을 믿었어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우리한테.
사민은 그들에게 잘해주었다. 함께 밥을 먹고 농담을 나눴다. 저녁에는 소파에 나란히 누워 영화를 보기도 했다. 그런 순간들은 종종 몹시도 편안하여, 그들은 사민이 낯선 사람이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렸다.
―그 가방을 보기 전까지는요.
진우가 헛웃음을 흘렸다. 그도 가방을 알았다. 사민이 가진 물건은 그뿐이었다. 두 개의 가방. 낡고 부드러운 배낭과 은색 캐리어, 그 안에 진우의 가장 큰 프로젝트를 갖고 사라졌다. 그들은 다시 차에 올라탔다. 일과 란은 가방 속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끝내 말하지 않았다. 몇 장의 그림과 거기 남긴 기록을 보았노라고 말했을 뿐이다. 진우도 재촉하지 않았다. 깨지는 순간을 기다려야 했다. 그가 잘하는 일이었다.
―저기요.
란의 목소리에 진우가 고개를 돌렸다. 뒷좌석의 쌍둥이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는 기다림의 목적지를 보았다. 작은 파열음이 들린 것도 같았다.
―그 사람이 P를 만들었나요?
한강을 건너자 또 한번 서울이었다. 진우는 숨을 들이마셨다. 침묵으로 대답에 힘을 실었다. 그래. 그가 말했다. 그 사람이 만들었다. 그 모든 도둑질이 바로 그걸 위해서였다고.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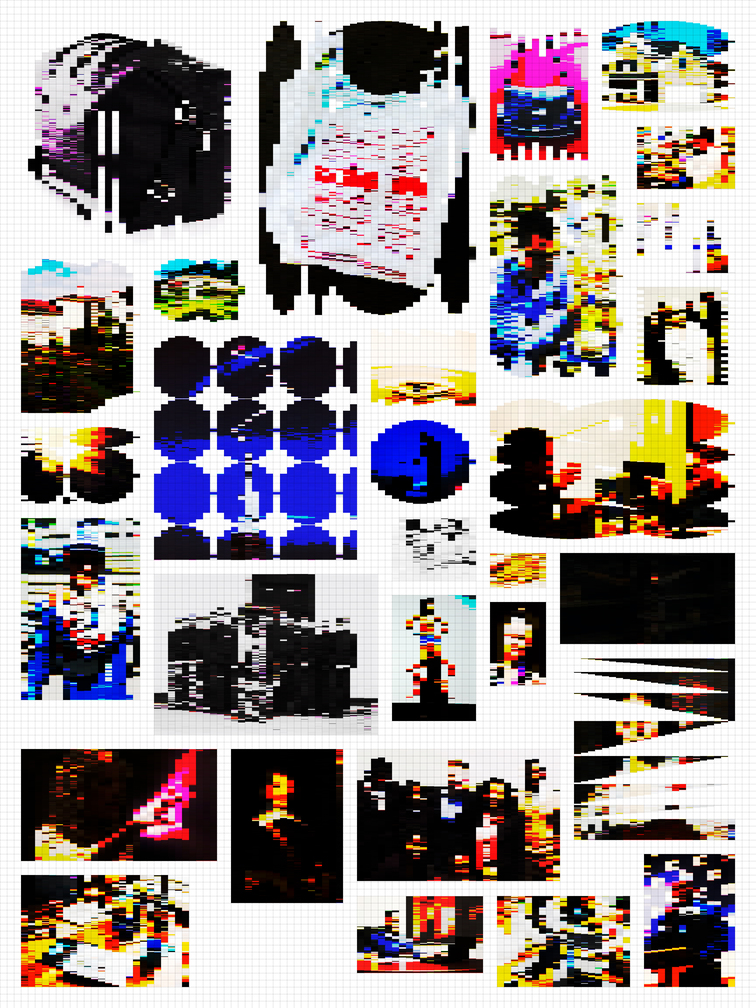 집으로 돌아온 사민은 텅 빈 방과 가방을 발견한다. 그는 새로운 이미지를 찢으려다가, 포기한다.
집으로 돌아온 사민은 텅 빈 방과 가방을 발견한다. 그는 새로운 이미지를 찢으려다가, 포기한다.
작업 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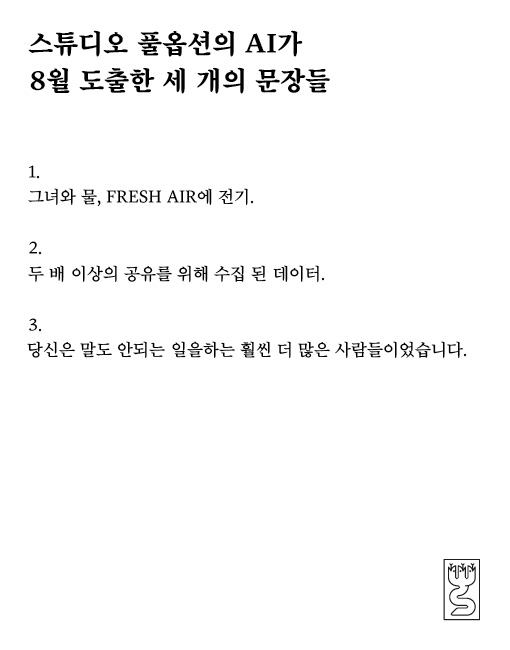 ※스튜디오 풀옵션의 AI는 지난 8월, 구글의 뉴스 데이터를 모조리 빨아들인 뒤 재조립했다. 위의 세 가지 문장은 AI가 수집한 데이터를 완전히 다른 배열들로 새롭게 추출한 것이다. 이는 스튜디오 풀옵션이 본 프로젝트를 제작하는 첫번째와 두번째 단계에 해당한다.(〈P!ng〉의 프롤로그에서 나타나는 첫번째 단계 참고. 바로가기) 우리는 위 문장들을 구글에 던져 건져낸 이미지들을 P의 예언 삼아 4화를 제작하였다. 풀옵션의 AI와 P를 통해 두 세계는 미미하게 연결되고 있다.
※스튜디오 풀옵션의 AI는 지난 8월, 구글의 뉴스 데이터를 모조리 빨아들인 뒤 재조립했다. 위의 세 가지 문장은 AI가 수집한 데이터를 완전히 다른 배열들로 새롭게 추출한 것이다. 이는 스튜디오 풀옵션이 본 프로젝트를 제작하는 첫번째와 두번째 단계에 해당한다.(〈P!ng〉의 프롤로그에서 나타나는 첫번째 단계 참고. 바로가기) 우리는 위 문장들을 구글에 던져 건져낸 이미지들을 P의 예언 삼아 4화를 제작하였다. 풀옵션의 AI와 P를 통해 두 세계는 미미하게 연결되고 있다.
위 모든 과정은 프로그래밍 언어 Python을 통하여 제작되었다.
쌍둥이의 이야기는 이틀 뒤에야 진우에게 도착했다. 그는 되풀이하여 물었다. 납치, 납치라고요? 직원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했다. 그걸 납치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획된 도주 같다고 해야 할지……
쌍둥이를 생각하지 않아도 삶은 문제없이 굴러갔다. 지난 이십 년 간 이름으로만 알아온 존재들이었다. 그들의 부재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누구도 그들을 모른다. 이름조차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다. 그들이 태어난 나라에서도, 한국에서도.
그럼에도 종종 속이 거북했다. 작은 손이 배 안쪽을 긁는 듯했다. 직원이 말했던 여자에 대한 생각도 떠나질 않았다.
그 여자.
진우는 이틀 간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여자가 대기실에 제출한 서류를 모조리 읽고, 여자를 만난 직원의 이야기를 들었다. 새벽빛이 밝아올 즈음에 확신했다. 사민이다. 사민이 그들을 데려갔다. 어떻게 쌍둥이를 발견하고, 왜 그들을 데려갔는지 어느 하나 명확한 게 없었다. 여자가 사민이라는 사실만이 분명했다. 진우는 오래 묵힌 연락처들로 전화를 걸었다. 그는 여전히 사민의 이름만으로도 끓어오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았다.
며칠이 지나도 일과 란의 소식은 없었다. 진우는 동요하지 않았다. 쌍둥이는 잘 있을 것이다. 그들 자신이 납치당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그는 사민의 방식을 알았다.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굴러간다고 느끼는 순간 주도권을 빼앗는.
그럼에도 그들은 대체 어디에 있을까? 사민의 차를 추적하기란 불가능했다. 비서는 난감한 얼굴로 말했다. 애초에 일과 란이라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으므로, 납치의 여부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진우는 목을 길게 폈다. 인내심이 필요했다. 그는 그런 일에 능했다. 사방을 살피고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는 일. 오래 전 아시아의 왕들은 왕관 위에 새들을 올려두었다. 새들은 목을 곧추세운 채 주위를 살폈다. 적들이 다가오면 큰 소리로 짖었다. 언제나 진우는 자신이 왕보다, 왕관 위에 놓인 새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이번에는 무엇이든―그게 비록 자신에게 온갖 곤란함을 안겨다주더라도―사민이 가져가게 두지 않겠다. 그는 여러 차례 되뇌었다.
그해 장마는 이르게 시작하여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밤낮으로 묵직한 공기가 그를 억눌렀다. 마침내 해가 뜬 날, 한 통의 전화가 왔다. 발신자 제한 번호였다.
―우리 좀 데리러 와줘요.
건너편에서 란이 말했다.
쌍둥이는 텅 빈 공사장 한가운데 서 있었다. 반쯤 세워진, 혹은 반만 허물어진 건물 앞이었다. 그들은 좋아 보였다. 얼굴에 살이 오르고, 머리카락에 윤이 돌았다. 그들은 진우의 차가 방지 턱을 뛰어넘어 달려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진우가 창을 내렸다.
―정말로 걱정 많이 했어.
란과 일은 뒷좌석에 탔다. 진우는 룸미러로 몇 차례나 그들을 살폈다. 쌍둥이는 말이 없었다. 차만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폐허를 떠났다. 고속도로에 올라탔을 때, 진우는 물었다.
―이름은 들었어?
일이 고개를 저었다. 란은 창밖만 바라보았다. 진우가 속삭였다.
―그 여자의 이름은 사민이야.
쌍둥이들은 룸미러를 보았다. 그 안에 비친 진우의 얼굴이 새빨갰다. 이마는 땀으로 번들거렸다.
―본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해 전까지 함께 일했어.
그들은 지하에서 함께 머물렀다. 진우는 그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연구소’라고 부르지만,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지하실’이라고 호칭하던 곳이었다. 밤낮으로 거대한 컴퓨터를 돌려야 했으므로 항시 추웠다. 천장과 벽에서는 늘 물소리가 들렸다. 직원들은 여름에도 두툼한 옷을 걸치고 일했다.
그들은 매일 정보들을 끌어 모았다. 활자와 사진, 영상, 녹취본,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뉴스부터 몇십 년 전 신문들의 기록들을 수집했다. 그들끼리는 “신전을 짓는다”고 불렀다. 과거를 갖고 미래를 짓는 일이라고들 했다. 거창한 표현이었으나, 틀린 말은 아니었다. 기록과 계보를 오래 들여다보면 몇 가지의 미래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그뿐이면 충분하다. 무너지는 건물들을 복구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난 그렇게 믿었다.
진우는 말했다. 비슷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한곳에 모여서 일했다고. 본인들의 사리사욕일랑 없다는 양, 밤낮으로 지하실에 눌러앉았다.
사민은 수석 연구원이었다. 밤낮으로 돌아가는 컴퓨터를 제외하면, 연구소에서 사민보다 더 긴 시간 일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관사와 연구소만을 오가며 데이터를 모았다. 마지막에는 그 모든 것을 갖고 사라졌다. 신전의 기둥과 지붕, 제단 중 어느 것도 남기지 않았다. 나는 그 사람을 믿었어. 진우가 말했다.
―내가 만난 가장 끔찍한 사기꾼이야.
그는 고개를 돌렸다. 쌍둥이들의 얼굴이 새파랬다. 속이 안 좋으니 좀 내려줘요. 그들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한강은 서울보다도 먼저 시작되었다. 그들은 강변에 앉았다. 서울로 향하는 물결들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무수한 빛들이 흘러갔다.
일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담담한 목소리로, 사민을 만난 첫날을 묘사했다. 도중에 란이 끼어들었다. 나중에는 두 사람 다 동시에 말하거나, 말할 순번을 정하기 위해 소리를 지르며 다퉜다. 진우는 가만히 있었다. 그들을 말릴 생각은 없었다. 쌍둥이의 울분은 커다랗고 오래된 듯 보였다. 그것을 깨부수는 순간을 방해하다가는, 그들이 다시는 자신을 믿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여러 차례 불신을 쌓아놓은 터였다.
쌍둥이는 자신이 지낸 도시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 열흘 내내, 사민이 마련해둔 집에서만 지냈다. 사민은 저녁마다 왔다. 양손마다 음식과 옷가지를 가득 들고.
―아주 새집이었어요, 빈 아파트. 방 세 개와 화장실 두 개.
꿈에서나 바랄 법한 집이었다. 수도꼭지를 돌리면 언제든 물이 나왔다. 일과 란은 처음으로 각방을 쓸 수 있었다. 한 달 정도를 숨어 지내다가, 여자와 함께 통로를 살피기로 했다. 쌍둥이는 번갈아 말했다. 여기서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통로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을 믿었어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우리한테.
사민은 그들에게 잘해주었다. 함께 밥을 먹고 농담을 나눴다. 저녁에는 소파에 나란히 누워 영화를 보기도 했다. 그런 순간들은 종종 몹시도 편안하여, 그들은 사민이 낯선 사람이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렸다.
―그 가방을 보기 전까지는요.
진우가 헛웃음을 흘렸다. 그도 가방을 알았다. 사민이 가진 물건은 그뿐이었다. 두 개의 가방. 낡고 부드러운 배낭과 은색 캐리어, 그 안에 진우의 가장 큰 프로젝트를 갖고 사라졌다. 그들은 다시 차에 올라탔다. 일과 란은 가방 속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끝내 말하지 않았다. 몇 장의 그림과 거기 남긴 기록을 보았노라고 말했을 뿐이다. 진우도 재촉하지 않았다. 깨지는 순간을 기다려야 했다. 그가 잘하는 일이었다.
―저기요.
란의 목소리에 진우가 고개를 돌렸다. 뒷좌석의 쌍둥이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는 기다림의 목적지를 보았다. 작은 파열음이 들린 것도 같았다.
―그 사람이 P를 만들었나요?
한강을 건너자 또 한번 서울이었다. 진우는 숨을 들이마셨다. 침묵으로 대답에 힘을 실었다. 그래. 그가 말했다. 그 사람이 만들었다. 그 모든 도둑질이 바로 그걸 위해서였다고.
2
작업 노트
위 모든 과정은 프로그래밍 언어 Python을 통하여 제작되었다.
스튜디오 풀옵션
텍스트와 이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를 번역합니다. 가능한 멀리까지 공놀이를 지속하며 오해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글 쓰는 함윤이와 디자인 하는 김형도가 함께 만들었습니다.
2020/09/29
34호